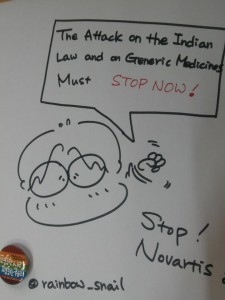[ 전 세계 인구의 10%를 살린 인도대법원 판결 ]
권미란(정보공유연대 IPLeft, HIV/AIDS인권연대 나누리+)
여러분, 약을 먹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든 적이 있으세요? 약값이 약국마다 다르네, 혹은 약을 독하게 처방한 건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, 무심결에 물과 함께 삼킬 때도 있겠지요? 저는 일주일에 이틀정도는 약을 만집니다. 하루 종일 빨간 약, 노란 약, 흰색 약을 만지다보면 이게 약인지 바둑알인지 별 느낌이 없어요. 그러다 가끔 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손발톱 무좀을 없애기 위해 화이자 사의 ‘디푸루칸’이 처방될 때입니다. 곰팡이균을 없애는 약인데, 이 약은 2000년대 초까지 개발도상국에 사는 에이즈감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. 에이즈환자나 암환자들은 면역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모균이나 곰팡이에 의한 질병으로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. 이때 이 약을 써야하는데 약값이 너무 비싸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조금 과장하면 이런 사연을 가진 약들은 피와 눈물이 묻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
2001년 어느 봄날 제 구실을 못하는 약이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.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위장관기질종양을 치료하는 ‘글리벡’이라는 항암제입니다. 10년이 넘는 이 약의 긴긴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까?
-더 보기: 천주교인권위원회 월간소식지 ‘교회와 인권’